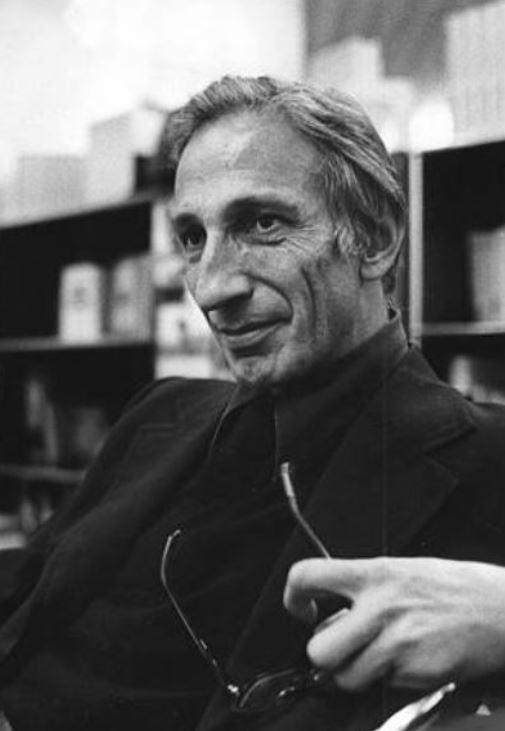전유될 수 없는 것을 제도화하기
- 저자 : Pierre Dardot, Christian Laval, Tran. Matthew MacLellan
- 원문 : “Instituting the Unappropriable”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아래는 Common : On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의 III부 마지막 장 “Post-Script on Revolu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서 “Instituting the Unappropriable”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대목을 비교적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원리로서의 공통적인 것의 핵심 특징들을 10개 단락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 우리는 ‘common’의 형용사 형태(‘공통적인’)보다 명사 형태(‘공통적인 것’)의 중요성을 책 전체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심지어 책의 제목―Common : On Revolution in the 21st Centruy―에서 관사를 빼고 쓰기까지 했다. 우리의 목적은 공통적인 것을 사물이나 실체, 혹은 (사물에 속하는) 성질로 보지 않고 원리로 보는 우리의 관점을 아예 처음부터 나타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원리란 출발 시에 존재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또한 처음 사용되고 나면 쇠잔해지다 사라지는 ‘시초’도 아니고, 일단 떠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단순한 ’출발점‘도 아니다. 원리란 진정한 시작, ‘항상 다시 시작하는 시작’, 즉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끄는 시작이다. 그리스어 ‘아르케’(ἀρχή)는 ‘시작’과 ‘명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아르케는 그로부터 모든 다른 것이 파생되는 원천이다. 공통적인 것은 이후의 모든 정치활동을 명령하고 지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원리이다. 만일 이 용어의 논리적 의미를 더 좋아한다면, 원리란 합리적 명제나 입증의 전제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 용어에 부여했던 의미가 이에 부합한다. 9개의 정치적 명제― 본 블로그의 글 「커먼즈의 구성을 위한 9개의 정치적 명제」 참조―는 미래의 합리성을 이끌도록 계획된 전제들이며 더 나아가 공통적인 것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원리로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도록 언표된다는 의미에서 논리적 원리들로서 제시되었다.
-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의 다른 원리들과는 다르다. 공통적인 것은 정치적 원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정한 정치적 원리이다. ‘정치’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당한 것’을 집단적으로 규정하는 활동과 이 집단적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의사]결정 및 행동이다. 따라서 정치는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할당된 활동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전문직이나 경력도 아니다. 정치는 지위나 직업을 막론하고 공적 숙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욕망하는 사람들 모두의 일이다. 정치는 공적 숙의와 ‘단어들과 아이디어들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과학적 증명이나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정치의 꿈이 아직도 살아 있기는 하지만, 과학적 진실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는 기본적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숙의와 민중의 판단력의 발휘 없이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학적 정치’는 정치의 한 형태가 아니라 기껏해야 과학을 통한 정치의 (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이다.
- 정치적 원리로서 공통적인 것은 동일한 활동에의 참여를 정치적 의무의 토대로 삼는다. 공동-의무로서의 공동-활동이다. 우리는 ‘common’이라는 용어의 뿌리에 놓여있는 ‘munus’라는 용어가 의무와 활동을 모두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그 어떤 형태의 소속―민족, 국민, 인류 등―도 그 자체로 정치적 의무의 기반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무는 신성한 종교적 특징을 가질 수 없다. 이는 그 어떤 초월적 원천도, 활동 외부의 그 어떤 권위도 거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적 의무는 전적으로 공동의 행동에서 나온다. 그것은 자신들의 활동을 다스리는 규칙들을 집단적으로 다듬어낸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실천적 헌신으로부터 그 모든 힘을 끌어낸다. 그것은 바로 이 활동에의 공동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만 타당하다.
- 그렇기에 공통적인 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욕망이나 의지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공통적인 것은 모든 형태의 대상화에 저항한다. 심지어 공통적인 것이 어떤 대상이 욕망함직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성질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을 종종 ‘공동선’(common good)이라고 불리는 것과 혼동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정치철학 담론에서 공동선은 함께 추구하고 함께 규정하는 바의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공동선은 그것이 모든 형태의 집단적 숙의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동의 편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한에서 종종 정당한 것과 혼동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선은 탁월하게 욕망함직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공동선’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선’은 항상 공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통적인 것이 대상으로서의 ‘공동선’의 추구를 이끄는 원리이다. 공동선의 진정한 추구에는 공동의 숙의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공통적인 것이 항상 ‘공동선’에 선행한다.
- 공통적인 것이 대상이 아닌 한, 그것은 사물(res)도 아니고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나 특징도 아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을 이러저런 자연적 혹은 내재적 속성 덕분에 공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빛이나 공기가 ‘커먼즈(공통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공통적인 것 되기’(being the common)와 같지 않다. 또한 공통적인 것은 법적 커먼즈(공통재)의 다양한 형태들―이는 물질적일 수도 있고(대양, 여러 국가에 걸쳐 흐르는 강,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지정된 곳들) 비물질적일 수도 있다(아이디어들, 과학적 정보, 발견, 공적 도메인에서의 지적 생산물 등)―과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법적 범주인 ‘공통적 사물’(res communis)은 공통적 대상들을 활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분리해내게 마련이다. 공통적 사물이 진정으로 공통적인 되는 것은 활동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을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은 내버려야 한다.
- 다른 한편, 우리는 ‘나눔’(sharing)이나 ‘한데 모으기’(pooling)를 통해 공통적이 된 대상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커먼즈를 말할 수도 있다. 본래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집단적 실천만이 어떤 사물 혹은 일단의 사물들의 공통적 성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커먼즈는 그 커먼즈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활동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도화하는 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물론 공통적 대상/자원의 자연적 속성들이 그런 대상/자원을 공통적으로 만드는 활동의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바로 이 활동이 주어진 대상을 ‘공동화하고’ 그렇게 공동화된 상태의 유지에 관여되는 특수한 규칙들의 산출을 통해 그 대상을 제도적 공간에 각인한다.
- 공통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와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공통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제도적 행동으로부터 생성된다. 공통적인 것이 원리라는 사실만으로 이 원리가 현실적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일 공통적인 것의 원리가 제도화될 필요가 없고 인식되기만 하면 된다면, 모든 커먼즈는 이미 공통적인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특정의 작동 규칙들을 정하는 실천들에 의해서만 제도화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제도화는 공통적인 것을 창조하는 시초적 행동을 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애초에 제도의 규칙들을 수립한 바로 그 실천들이 그 규칙들을 변경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도화하는 프락시스’(instituent praxis))라고 부른 것이다. ‘제도화하는 프락시스’는 결정의 힘으로부터 분리된 행정력이라는 의미의 ‘관리’의 한 형태가 아니다. ‘관리’라는 환상은 사실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연주의적 견해―만일 공통적인 것이 사물들의 자연적 속성들의 함수라면, 그것이 가진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공간을 가로지르는 실제적인 사회적 갈등들로부터 분리된 관리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와 연결되어 있다. ‘거버넌스’는 ‘관리’와는 달리 사회적 갈등을 포용하며 공통적인 것을 다스리는 규칙들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통해 그 갈등을 다룬다. ‘제도화하는 프락시스’란 이렇듯 공통적인 것을 수립하는 집단들이 커먼즈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 정치적 원리로서 공통적인 것은 공적인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커먼즈는 생산과 교환의 영역 전체를 사적 이익집단들의 싸움이나 국가독점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시장과 국가 사이의 ‘제3의 길’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사적인 것 및 공적인 것과 함께 병존하는 경제의 ‘제3부문’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공통적인 것의 우선성은 사유재산의 폐지를 함축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시장의 폐지를 함축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공통적인 것의 원리는 시장의 공통적인 것에의 종속을 요구하며 이런 의미에서 소유권과 시장의 제한을 함축한다. 상업적 교환의 영역으로부터 특정 대상들을 단순히 빼내어 공동의 사용을 위해 보존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사물이 소유자의 이기적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을 허용하는 남용권을 폐지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 만일 공통적인 것이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을 가로지르는 횡단적인 정치 원리라면, 그리고 커먼즈들이 특정의 대상들(그 유형이야 어떻든)과 연관된 특정의 실천들에 의해 열리는 제도적 공간들이라면, 사회적 커먼즈만이 아니라 정치적 커먼즈도 있다는 말이 된다. 정치적 커먼즈는 ‘공적 일들’에 모든 수준에서, 즉 지역에서 일국을 거쳐 전지구적 수준까지 관여한다. 사회경제적 영역은 사회적 활동이 연합의 논리에 따라 확대되는 어느 곳에서든 그 활동의 기준에 의해서만 조직된다. 정치적 영역은 마찬가지로 연합의 논리에 따라 조직되는 여러 수준들을 통해 엄밀하게 영토적인 기반 위에서 조직된다. 지방자치는 정치 영역에서 기본적인 형태의 자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공통적인 것의 세포적 형태이다. 일원적이고 중앙집중적이며 주권의 원리에 의해 질서지어지는 국민국가 모델은 이 논리에 의해 엄밀하게 금지된다. 공통적인 것의 정치적 원리는 이렇듯 이중의 연합에 기반을 둔다. ① 사회전문적인(socio-professional) 기반에 도태를 둔 사회경제적 커먼즈들의 연합과 ② 영토적 기반에 토대를 둔 정치적 커먼즈들의 연합이다. 이 두 영역이 함께 공통적인 것의 민주주의를 이룬다.
- 원리로서의 공통적인 것에는 전유될 수 없는 것의 규범이 소중하게 담겨 있다. 공통적인 것의 원리의 근본적 목적은 이 규범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변형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전유(Unappropriation)는 전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유되어서는 안 되는 것, 즉 공동의 사용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전유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무엇이 전유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화하는 실천의 몫이다. 전유될 수 없는 것이란 제도화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전유불가능성 그 자체에 기반을 둘 수 있을 뿐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전유불가능성을 제도화려는 의지는 이 전유불가능성이 정의상 전유 행동에 관여하는 하나 혹은 다수의 주체들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는 집단적 주체가 사실상 공통적인 것을 제도화하는 행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 이 행동에 선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두 종류의 전유―어떤 것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귀속으로서의 전유’와 어떤 것이 특정의 목적을 향하도록 하는 ‘목적지향으로서의 전유’(특히 사회적 욕구의 충족)―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다. 전유불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특정 형태의 ‘목적지향으로서의 전유’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전유로부터 무언가를 빼내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어떤 사회적 목적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전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식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땅을 전유하는 것) ‘전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공통적인 것의 원리는 재산을 창출하지 않고, 커먼즈의 임자인 양 커먼즈를 처분하는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으면서 사용을 규제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공통의 재화’(common goods)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용어가 계속되는 투쟁을 위한 단합의 구호로서 전략적인 효용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말이다. ‘공통의 재화’란 없다. 오직 제도화해야 할 커먼즈, 혹은 공통적이 되어야 하는 커먼즈만 있다.(Th ere are no “common goods”: there are only commons to be institutionalized, or commons to be made com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