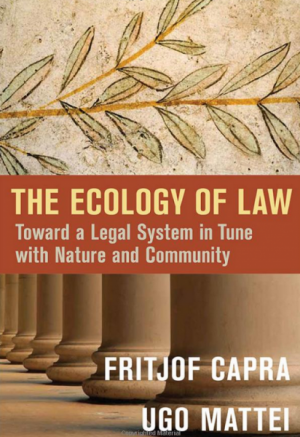강추!! 카프라와 마테이의 『법의 생태론』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2015년 10월 9일자로 게시된 글 “Highly Recommended: Capra & Mattei’s The Ecology of Law”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강추!! 카프라와 마테이의 『법의 생태론』
옮긴이 : 정백수
커먼즈 기반의 법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새 책이 막 나왔다! 『법의 생태론―자연 및 공동체와 조화되는 법체계를 위하여』(The Ecology of Law: Toward a Legal System in Tune with Nature and Community)』는, 앞으로 많은 환경 문제들을 풀려면 법 자체를 다시 개념화해야 하며 커머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과학과 법 분야에서 각각 모험적 정신이 돋보이는 카프라(Fritjof Capra)와 마테이(Ugo Mattei)의 작업의 결과이다. 카프라는 물리학자이자 체계이론가(systems thinker)로서 1975년에 그의 책 『물리학의 도』(The Tao of Physics)로 처음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이 책은 근대 물리학과 동양 신비주의를 연결하고 있다. 마테이는 이탈리아의 잘 알려진 커먼즈 법이론가이자 국제적인 법학자이며 커먼즈 활동가로서, 샌프란시스코의 헤이스팅스 법과대학과 투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있는 키에리(Chieri) 타운의 부시장이다.
『법의 생태론』은 법의 역사를 과학적·기계론적 세계관의 산물―만일 우리가 생태적 재난을 비롯한 많은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극복해야 하는 유산―로서 야심차고 거시적으로 서술한다. 이 책은, 근대적 사고방식(사유의 템플릿) 자체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심각한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근대적 사고는 개인들이 집단의 안녕과 생태적 안정에 가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지고의 행위자라는 특권을 부여한다. 근대는 또한 세계를 관찰 가능한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단순화된 기계론적 관계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며, 주체성·돌봄·의미와 같은 더 섬세한 삶의 차원들을 무시한다.
카프라와 마테이는 이에 대한 교정으로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일단의 새로운 커먼즈 기반 제도들을 제안한다. (이때 법은 그 자체로 전통적인 국가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 세련된 재야 이론가들이, 커머닝에 기반을 두며 새로운 종류의 ‘생태법’(ecolaw)에 의해 보호받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개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멋진 경험이다. 카프라와 마테이는 자연과학과 법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유사점들을 스케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과학과 법 모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유된 개념들을 반영하고. 우리는 여전히 로크, 베이컨, 데카르트, 그로우셔스(Hugo Grotius)1, 홉스가 그려낸 우주론적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세계를 원자론적 개인들과 기계론적 원리들이 지배하는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질서로 보았다. 이런 세계관이 경제학, 사회과학, 공공정책, 그리고 법에서 계속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생태론』이 가진 대담함은 근대의 병리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겠다고 주장한 데 있다. 이 세계관이 많은 생태적 재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있으며,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학이 어떻게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 요소인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카프라와 마테이에 따르면, 근대는 사유재산과 국가 주권의 신성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재의 ‘객관적인’ 자연적 재현으로 간주되는 질서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 ‘개인’과 ‘집단’의 구분 또한 실재의 자명한 서술인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커먼즈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극히 환원론적이며 우리를 오도한다는 것을 안다. 커머닝은 인간들이 세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해하는 데 더 통합된 범주들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 경험상으로 개인들은 집단 내에 삶의 자리를 잡고 있으며 다른 개인들과 협력함으로써만 발전하고 번영한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서로 혼합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르는 경계가 모호하다. 근대에 전형적인 양자택일의 구도(‘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일종의 합의된 사회적 허구이다.
근대 사회에서 법은 사유의 (오도하는) 범주들을 긍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법은 개별 시민에게 부과되는 외적 한계는 없으며, 개인 각각은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연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자연을 향상시키며 가치를 창조하고 인간의 진보를 더 진척시키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미친 듯 날뛰어 지구를 파괴하기에 이른 사회적 DNA이다. 근대의 세계관에서는 역사도 없고 사회적 참여도 맥락도 없는 고립된 행위자들인 개인들이 변화의 주된 동인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개인들에게 마음껏 자신만을 생각하고 쾌락을 즐길 허가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계속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한 자본주의적·자유방임적 망상이다.
그렇다면 탈자본주의적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거나 새로운 일단의 정책을 입안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심층적 전제들과 대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과 법에서 전과 다른 자연관과 인간관을 반영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카프라와 마테이는 주장한다. 우리는 세계를 기계로 보는 패러다임에서 세계를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로 보는 체계론적이고 생태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은 ‘저 외부에’ 객관적 실재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질서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힘이다. 카프라와 마테이는 “법은 항상 커머닝의 과정이다”라고 쓰면서 법이 커머너들의 공동체들에서 출현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이 통찰이 우리가, ① 법을 권력과 폭력(국가)으로부터 분리할 것, ② 공동체들을 주권자로 만들 것, ③ 소유권을 생성적인(generative)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생태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법의 생태론』을 관통하는 풍성한 통찰의 가닥들을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저자들이 한 주장의 풍미를 같이 맛보는 데 머물기로 하자.
최종적인 무질서로 달려가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구조적 해결책은 법을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들에 되돌려줌으로써 인간의 법과 자연의 법 사이에 일정한 조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만일 법의 본성이 지역의 조건들과 근본적 욕구들을 반영하면서 진화하는 공통적인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쏟을 것이다. 사람들은 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조직된 유관 집단의 손에 계속해서 쥐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법을 만들고 사용하는 주체들인 것이다.
문화와 진정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한 혁명인 법에 대한 생태론적 이해는 위계와 경쟁을 법적 질서의 ‘올바른’ 내러티브로 보는 사고를 극복한다. 이 생태론적 이해에서는 네트워크라는 은유,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개방된 공동체라는 은유를 통해 부분들과 전체 사이의―개별적인 권리들·의무들·권한들·힘과 법 사이의―복합적인 관계들을 포착하려고 한다.
커먼즈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고 자신들의 법을 입법하고 시행한다. 그들은 모든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초연해 있으며/있거나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모든 주장으로부터 초연해 있다. 그들은 삶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인위적 구분을 극복한다. 여기서 법의 해석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집단적 의미를 공유하는 일로서 수행한다. 법은 권력과 폭력에의 의존으로부터 분리되면 언어, 문화 혹은 기예와 같은 것이 된다. 법은 집단이 서로 소통하고 스스로에 대해 결정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 Hugo Grotius : 네덜란드의 법학자로서 국제법의 기초를 마련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