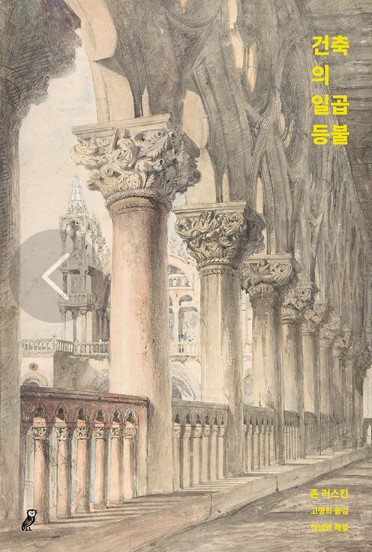건축의 일곱 등불
- 저자 : 정남영
- 분류 : 번역서 해설
- 설명 : 최근에 부북스에서 출간된 번역서 『건축의 일곱 등불』(존 러스킨 지음)에 붙인 해설 가운데 1절과 4절을 여기 올린다. 여기서 해설자는 번역서의 내용을 직접 다룬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틀을 제시한다. 주석 번호는 책에서의 주석번호이며, 2절과 3절의 주석들인 21번부터 71번이 비어 있다. 해설 전체는 총 5절로 되어 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한겨레신문(2024년 9월 20일자)에서 볼 수 있다.
I. 러스킨과 근대
나의 러스킨 공부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 영국 소설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가르친 나는 문학 연구보다는 예술 연구로 알려져 있는 러스킨에게 처음에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 톰슨(E. P. Thompson)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01를 읽으면서 모리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의 존재를 새삼 인지하게 되어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베네치아의 돌들』(The Stones of Venice) 중 고딕 건축의 성격을 다룬 부분—러스킨이 모리스에게 영감을 준 바로 그 부분—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더 나아간 공부를 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하다가, 본서의 번역이 시작되고 해설을 맡으면서 비로소 좀더 공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러스킨을 잘 안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부이지만 말이다. 나는 영국의 소설가 디킨즈(Charles Dickens)와 로런스(D. H. Lawrence)에 공부를 집중했고, 영문학 연구와 아울러 한국 문학작품들에 대한 평론 활동을 했으며, 이와 함께 철학 분야로 공부를 확대하여 맑스, 들뢰즈·과타리, 네그리, 스피노자, 니체, 푸코 등을 읽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인 커먼즈(Commons) 운동의 진전과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과정에서 ‘커먼즈와 집’이라는 주제를 중요한 문제의식으로서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초점은 근대 극복 혹은 대안근대로의 이행에 맞추어져 있었다. 나는 러스킨의 저작들을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읽으면서 나의 이러한 공부나 관심사가 러스킨에게 들어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이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내가 이 해설에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해설은 당연히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건축가들이나 건축비평가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향한 것이다. 예술 및 건축 비평가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러스킨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책에 대한 해설이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새삼 필요할 리가 별로 없을 터이고, 더군다나 나는 건축 분야의 비전문가이므로 건축 전문가들을 위해 그럴듯한 해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러스킨 자신이 당시 영국 건축계의 주류와 서로 맞지 않았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건축가들과 건축 작가들은 러스킨을 경멸하거나 러스킨에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둘 다였다. 러스킨은 실제적이지 않거나 미친 것으로 간주되었다.02
건축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책에 매우 경탄하는 사람들 축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책의 범위를 종종 오해했다. 러스킨의 부수적 의견들 가운데 다수는 공상적이거나 의심스러웠다. 그는 건축가들의 견해를 무마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가 건축계 앞에 세우는 이상들은 준엄했다.03
물론 결과적으로 러스킨의 작업이 건축예술의 품격을 천명하고 평판을 높이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건축계의 주류와의 차이가 좁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대 건축계와 러스킨의 차이는 특정 전문분야에서 일어나게 마련인 견해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했던 것이다.
「삶과 그 예술의 신비」(“Mystery of Life and its Arts”)에서 러스킨은 자신의 삶을 실망과 좌절의 연속으로 개관한다. 그는 스무 살에서 서른 살까지 그의 “삶의 가장 강렬한 10년” 동안, 레이놀즈(Joshua Reynolds) 이후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라고 생각하는 터너(J. M. W. Turner)의 예술가로서의 우수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더군다나 터너는 이 노력의 “피상적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사망했다.04 러스킨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헛되이 창작하다 헛되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터너는 러스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러스킨은 회화 연구를 하면서 건축 연구를 병행했다. 자신의 말로는 회화 연구에서보다 “덜 열심일지는 몰라도 더 신중한 노력”을 투여했다고 한다.05 러스킨은 건축의 경우에는 회화의 경우와 달리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한 러스킨의 노력도 (이미 당대의 건축계 주류와의 관계를 언급한 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대세에 밀려서 좌절되었다. “우리가 도입하려고 한 건축은 현대 도시들의 분별 없는 사치, 형태를 왜곡하는 기계적 구조, 지저분한 비참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 나는 나의 힘의 이 새로운 부분 또한 헛되이 쓰였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철로 된 거리들과 수정으로 된 궁전들에서 물러나 지질학과 식물학 연구로 관심을 돌렸다”.06
그 이후에도 영국의 주류 사회는 러스킨에게 도통 맞지 않는 곳이었다. 러스킨은 당대의 현실로 관심을 돌리면서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나아갔는데, 이 비판 또한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 추진 세력에게는 당연히 못마땅한 것이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1860년에 일련의 정치경제학 비판 글들이 『콘힐 매거진Cornhill Magazine』에 연속으로 실리다가 (편집자의 우호적인 태도와 과감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들과 출판사의 반대로 네 편에서 중단된 일이다. (이 글들은 나중에 Unto This Last라는 책으로 출판된다.)07 사실 앞에서 말한 “근본적인 차이”―즉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는 건축계 주류와의 사이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 영국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세력들 전체와의 사이에도 존재했었다. 당대의 자본주의 추진 세력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이다. 즉 인간의 모든 능력과 힘을 물질적 효용을 생산하는 수단으로만 본다. 이들은 “고기가 삶(생명)보다 가치 있고 옷이 몸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땅을 마구간으로 보고 땅의 결실들을 말 사료로 보는” 자들이다.08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상품화된 물질적 효용 즉 교환가치의 재현자인 자본의 축적이다.
이와 반대로 러스킨은 물질적 효용을 삶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본다. 그리고 예술처럼 그 자체로는 물질적 효용이 없는 ‘무용함’이 삶의 목적이다. ‘무용함’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이 아니다. ‘무용함’은 공리주의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낼 뿐이고, 러스킨이 깊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술을 비롯해서 삶의 목적이 되는 어떤 대상을 신의 활력을 분유(分有)한 것으로 보는 태도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09 철학적 의미의 ‘신’으로 읽으면 된다. 사실 러스킨의 철학은 그것이 활력의 철학이라는 점에서 스피노자와 통하는데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신’은 ‘무한한 활력’에 다름 아니며, 러스킨에게 있어서도 그렇다. 러스킨은 이 무한한 활력이 만물에 나뉘어 부여되어 있고 만물은 이 활력으로 인해서 그 나름대로 신성하고 아름답다고 본다. 물론 아무나 이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공감하고 경탄하고 기뻐하는 활력이 필요하다. (이것 역시 신이 부여한 활력이다.) 그래서 러스킨이 “인간의 효용과 기능은 … 신의 영광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10 그는 특정의 종교적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인간’에게서 활력이 가진 핵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활력은 개인마다, 집단마다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역사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겪는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 거의 전체에 걸쳐서 이 활력의 상태에 전에 없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로 인해서 예술적 능력은 쇠퇴하고 이 쇠퇴에 대한 감이나 인식이 없는 근대 추진자들과 이들을 비판하는 러스킨 사이에 근본적인 어긋남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제 활력의 상태에 생긴 이 문제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삶과 그 예술의 신비」에서 러스킨은 ‘인간의 일’, 즉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띠고 사는 동안”11 해야 하는 일로 ① 먹을 것을 생산하기, ② 입을 것을 생산하기, ③ 거처를 만들기, ④ 예술이나 과학 등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를 든다.12 ①, ②, ③은 물질적 효용의 차원인데, 앞으로는 ‘유용성의 차원’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④는 삶이 단순한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 꽃처럼 피어나는 차원인데, 이는 ‘활력의 차원’이라고 부르기로 하자.13 ①, ②, ③, ④ 모두 인간의 힘이 자연력과 결합하는 방식을 나타내는데, 이 방식은 이 두 차원을 따라 둘로 나뉜다. 유용성의 차원은 물질의 법칙이 적용되는 차원으로서 자연력이 인간에게 이전되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가령 자연력이 인간으로 이전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전된 양만큼 자연에서는 감소된다. 활력의 차원에서는 자연력이 감소되지 않고 거기에 각인된 인간의 힘과 함께 결합된 상태로 보존되며, 이 과정에서 양자 모두가 새로운 차원의 힘으로 상승한다.
이제 인간의 삶의 역사의 정상적 진전은 유용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 활력의 차원에서 각 집단(민족 등)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가능한 만큼 최대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 되기’라고 부르기로 하자. 두 차원 모두를 놓고 볼 때 둘째 차원이 이 과정을 비로소 ‘인간 되기’로서 결정한다. 만일 둘째 차원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첫째 차원을 충족하는 데서 끝난다면, 그것은 ‘만족한 동물’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14 둘째 차원이 이런 의미에서 결정적이지만, 사실 두 차원이 모두 필수적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서 생존 없이는 활력적인 삶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유용성의 차원에서 예술성이 자라나온다는 점이다. 사물을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바꾸는 능력인 기술(특히 손기술)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예술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러스킨은 “모든 건축예술은 컵과 받침대의 모양을 짓는 데서 시작해서 멋진 지붕에서 끝난다”고 한다.15
러스킨에게 근대는 이러한 ‘인간 되기’의 경로에서 이탈한 시대이다. 러스킨의 시선에 먼저 들어온 것은 예술적 능력의 전반적인 쇠퇴이며, 그 다음에 그가 주의를 돌린 곳에서 본 것은 자본주의적 번성이라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처참한 민중의 모습이다. 러스킨은 이 모습을 서양의 긴 역사적 과정에 놓고 한탄한다. 6천 년 동안 농업이 이어져 왔음에도 50만 명이 굶어죽는 일이 발생하고16 6천 년 동안 직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수도들의 거리는 내다버린 누더기와 썩은 넝마의 판매로 악취가 나며, 6천 년 동안 집짓기를 해왔음에도 그 모든 기술과 힘의 대부분이 흔적도 남아 있지 않고 떨어져 나온 돌들만 들판에 거추장스럽게 나뒹굴거나 시냇물에서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17
유용성의 차원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유용성의 차원과 활력의 차원 사이의 건강한 연결이 단절된다. 인구의 다수가 유용성의 차원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편, 이 욕구를 충족시킨 소수는 물질적 이익의 차원에서 더 많은 축적(수익, 이윤, 지대 등)을 원할 뿐 자연력과의 결합을 활력으로 상승시키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하여 활력의 양성과 발휘는 현저하게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러스킨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조건에서는 진정한 건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집들을 예술을 위해서든 사랑을 위해서든 짓고자 한다면—궁전을 그 자체를 위해서 짓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한다면―그런 사회는 볼 만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지 수익을 가져올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건축물은 자신을 위해 집을 원하는 사람이 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식으로 짓는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이 좋아하는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18
바로 이것이 근대에 와서 활력의 상태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되기’는 정체 혹은 후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러스킨에게 이러한 ‘인간 되기’의 실패가 절망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삶이 [그]를 실망시킬수록 삶은 [그]에게 더 근엄하고 놀라운 것이 되었”으며,19 그는 “예술 혹은 다른 분야에서의 모든 지속적인 성공은 … 인간의 전진하는 힘에 대한 근엄한 믿음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유한한 부분이 언젠가는 불멸성에 함입되리라는 약속에 대한 근엄한 믿음에 의해서 하위의 목적들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았고, 예술 자체는 이 불멸성을 천명하려는 노력에서만 … 힘찬 활력이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았다.”20
러스킨이 『건축의 일곱 등불』을 썼던 때(1849년)는 그에게 아직 희망이 있던 때였다. 그가 나중에 건축에 대해 말하기를 포기했지만, 이는 자신의 한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였다. 아무리 말해도 귀에 ‘돈’못이 박혀있는 근대의 주류 세력을 꿰뚫고 현실에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
IV 러스킨과 근대 너머
건축의 이러한 두 가지 특권은 예술 일반에 구현되는 모든 활력이 그렇듯 잠재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화는 늘 불투명하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현실화는 적어도 러스킨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다. 몇몇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사회를 대표하듯이 소수의 큰 건물들이 건축을 대표하며, 건축가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감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특화된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러스킨에게 예술은 삶의 기본 조건이 충족된 후에 시작된다. “모든 예술은 손으로 하는 동작과 당신의 민중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미덕과 친절함에 토대를 둔다.”72 민중이 기본적으로 어엿한 삶을 누릴 때, 민중의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물건들의 형태가 필요에 따라 변경되고 새로운 형태들이 고안되는 과정(가령 컵, 손잡이 달린 컵, 컵에 물을 따를 주전자, 손을 들고 다니기 더 좋은 손잡이 두 개 달린 주전자, 물을 대량으로 마실 컵, 섬세하게 마실 컵, 물 따르기 쉬운 주전자, 향수 보관하기 좋은 용기, 지하실에 저장하기 좋은 용기 등)의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예술이 성취한 가장 아름다운 선들과 가장 완벽한 유형의 엄밀한 구성이 발전해나온다.”73
더 나아가 건축은 민중의 주거의 필요에 따른 건물에서 시작해서 더 큰 건축물로 확대된다. 각자 자신의 지붕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이다. “모든 읍에 큰 지붕을 짓기 전에 작은 지붕들을 짓고, 원하는 누구나가 자신의 지붕을 가지도록 하라.”74 그 다음에 이 각자의 작은 집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한다. “그리고 집들이 도시에 한데 모여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축을 공통의 법칙에 종속시킬 정도로 시민적 우애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인간의 주거지들이 한데 모인 전체가 대지 위에서 끔찍한 것이 아니라 예쁜 것이 되기를 욕망할 만큼의 시민적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75 러스킨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청중들(현실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중들)을 향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것의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것의 불가결성에만 관심이 있다.”76
이 말을 좁게 이해하는 사람은 러스킨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일에는 별로 공을 들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 러스킨은 당대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는 단계 이후에 ‘인간’이 사는 곳을 실제로 만드는 일을 자신의 삶의 당연한 행로로서 추구했다. 그는 1871년 ‘영국의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들’(Letters to the Workmen and Labourers of Great Britain)이라는 부제가 붙은 『포르스 클라비게라』(Fors Clavigera)77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성 조지 길드>(St. George’s Guild)라는, 무엇보다도 토지와 동지 관계를 이루는 삶형태를 직접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준비를 시작한다.78
1878년에 『포르스 클라비게라』의 집필이 완료되고 <성 조지 길드>의 설립도 완료된다. 이로써 러스킨의 삶의 단계는 넷으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포르스 클라비게라』 ‘Library Edition’의 편집자는 이 책에 대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쉽고도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회화비평가로 시작한 그는 예술이 정말로 훌륭한 것이 되려면 아름다운 현실의 재현이어야 하고 즐거움의 정신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축비평가로서 활동하면서 그는 예술이 민족적 성격의 반영이며 고딕의 비밀은 건축공의 행복한 삶에 있음을 발견했다. 다음 단계는 그와 같이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단순했다. 그는 상상의 세계에서 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좋고 아름다운 것의 조건을 실제 세계에서 현실화하려고, 인간들 사이에 신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다.79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삶의 진행 과정 자체가 앞에서 말한 유용성의 차원과 활력의 차원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두 차원의 이러한 연속성 혹은 달리 말하자면 삶의 통합성이 바로 그가 우리의 시대에 가지는 의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의 통합성의 ‘불가결성’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심각해진 우리의 시대에는 러스킨의 시대와 비할 바 없이 절실한 것이 되었다는 점이 러스킨의 현재적 의미를 배가시킨다. 유용성의 차원과 활력의 차원의 분리야말로 지금 인류를 크나큰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기후 변화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인류사에서의 큰 진전으로 꼽을 근대화(산업화)가 바로 지구 전체를 장악하게 될 이 분리의 시작이었다. 근대화는 안타깝게도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의 결합에 왜곡이 가해지는 형태로 일어났다. (그 이전에는 결합의 정도가 낮고 범위가 좁았을지언정 왜곡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맑스가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소외’라고 부른
이 왜곡의 핵심은 현실에서의 인간이 앞에서 말한 진정한 의미의 ‘인간’에서 벗어난 데 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란, 맑스의 표현으로는 자연력과의 결합에서 자신의 본질을 구현하는 인간, 자연과 본질상의 공통체를 이루는 인간이다.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은 인간의 제2의 몸이었다. (이것을 맑스는 ‘비유기적 몸’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두 몸은 분리되며 자연은 몸의 지위를 잃고 그저 인간의 외부에 있는 ‘객체’가 된다. 그리고 인간은 이 ‘객체’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주체’가 되는데, 이 ‘주체’로서의 인간을 ‘객체’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이 자본이다. (사실 자본의 왕국에서는 개인들도 서로에게는 ‘객체’이며, 자본만이 실효적인 ‘주체’이다.)
이제 인간에게 내재하는 활력은 자연의 힘과의 연결을 매개하는 자본(화폐80)의 활력으로 오인되어 자본이 인간의 삶 위에 군림하게 되고, 인간과 자연 모두가 자본의 증식을 위한 수단이 된다. 자본은 신이 된다. 그런데 이 신은 인간에게 별로 호의를 갖지 않은 신이라서 이 신이 주도하는 생산은 러스킨이 ‘복종의 등불’ 장에서 말한 ‘복종’과 ‘절제’의 능력을 쇠퇴시킨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복종’과 ‘절제’의 능력이란 맑스의 말로는 ‘아름다움의 법칙에 맞춘 생산’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동물은 자신이 속한 종의 척도와 욕구에 맞추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인간은 모든 종의 척도에 맞추어 생산할 줄 알며, 일반적으로 대상에 내재하는 척도를 적용할 줄 안다. 따라서 인간은 아름다움의 법칙에 맞추어 만들어낸다.81
‘인간’은 자신의 척도를 내세우지 말고 “일반적으로 대상에 내재하는 척도”를 알아내야 하며 그렇게 알아낸 척도를 따라야 한다(복종).82 그리고 인간의 힘을 여기에 맞추어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절제). 자본은 ‘아름다움의 법칙’이 아니라 ‘이윤 증식의 법칙’을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부과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다시 맑스의 말로 설명해볼 수 있다. 『자본론』 1권 15장 10절에서 맑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인구를 대중심지로 집결시키며, 도시 인구의 비중을 끊임없이 증가시킨다. 이것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으로는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대사 즉 인간이 옷과 식량으로서 소비한 토지의 성분들이 토지로 복귀하는 것을 교란하고,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교란한다.83(인용자의 강조)
다시 말해서 자본이 주도하는 생산은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순환하는 데 (즉 두 ‘몸’ 사이의 질료 교환에) 장애를 일으킨다(‘물질대사의 교란’).84 그렇기에 “자본주의적 농업의 진보는 그 어느 것이나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술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를 약탈하는 기술의 진보이며, 일정한 기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는 그 어느 것이나 이 비옥도의 항구적 원천을 파괴하는 진보이다. (…)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파멸시킴으로써만 기술을 그리고 사회적 생산과정의 결합을 발전시킨다.”(인용자의 강조)85 이렇게 “모든 부의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를 파멸시”키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환경 파괴가 있다.
기후 변화를 아마도 영국에서 최초로 (과학자들보다 먼저) 간파한 사람이 러스킨일 것이다. 즐거움의 원천인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 러스킨은 1871년 어느 날 50년 동안 관찰해오던 하늘에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이상한 폭풍 구름(storm-cloud)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해서 관찰하게 된다. 러스킨은 이러한 관찰을 근거로 날씨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을 그의 『19세기의 폭풍 구름』(The Storm-cloud of the Nineteenth Century)에 실린 두 개의 강연86에서 하는데, 당시 언론은 러스킨의 주장이 “상상해냈거나 제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라고 조롱했다.87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이 현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러스킨의 관찰이 정확하고 그 원인도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되게 된다. 산업 통계에 따르면, 러스킨이 문제가 되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잡은 날짜는 영국에서나 중앙 유럽의 산업화된 나라들에서나 석탄의 소비가 비약적으로 올라간 때였다고 한다.88
러스킨은 당시에 자신이 관찰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지는 않았다. 성경에서 가져온 구절이나 용어로 제시할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러스킨이 이 현상의 근본적 원인—산업화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충분히 말해왔음을 안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에 대한 러스킨의 견해가 흥미롭다. 독자들이 가령 본서 4장에서 철도를 비판하는 대목을 보고 러스킨을 기계의 사용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는 성급하고 섣부른 판단이다. <성 조지 길드> 설립 취지문에 단 주석에서 러스킨은 이렇게 말한다.
길드에서 기계류는 그것이 건강한 육체적 활동을 대체하거나 장식 일에서 손노동의 기술과 정밀함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점을 세심히 유의해야 한다.89
고딕 건축물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보듯이,90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아래로부터의 도시 구축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보듯이, 러스킨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활력을 서로 합하여 거대한 것을 세워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기계도 그렇게 쓰일 수 있다면 러스킨이 반대할 리 없고 심지어는 그러기를 바란다. 실제로 러스킨은 영문학 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기계 예찬을 쓰기도 했다.91 맑스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러스킨이 반대하는 것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는 것이다. 기계는 인간의 일정한 활력의 결과물이지만, 기계에 인간이 예속되면 자연과의 동지 관계를 통해 증가되어야 할 활력이 오히려 감소되게 된다. “영국 다중의 활기가 연료처럼 공장의 연기의 먹이로 보내진다.”9293
자연력과의 관계에서도 러스킨이 반대하는 것은 자연력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 “… 기계류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동력은 바람이나 물의 자연력이다. 미래에는 전기력도 거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냇물과 바람이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연료를 사정없이 맹렬하게 낭비하는 증기력은 절대적으로 거부된다.”94
이렇듯 ‘착취된’ 인간의 힘(노동력)과 ‘착취된’ 자연력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의 동력이었기에 ‘인간’의 길을 다시 가는 것, 즉 자연과의 동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여기에 인간들 사이의 동지 관계의 회복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이 오늘날의 삶을 틀짓는 자본의 논리로부터의 해방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다만 ‘인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미리 정해진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때 ‘인간’이란 언제나 아직은 구현되지 않은 미지의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인간’으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 러스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릇된 일을 함으로써 더 현명해지거나 더 강해지는 일은 없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만 더 현명해지고 강해진다. 가장 으뜸가는 것, 필요한 단 하나는 강압 아래서일지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 마침내 강압 없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인간’이다.95
“올바른 일”이란 러스킨의 말로는 ‘복종’과 ‘절제’의 일이고, 맑스의 말로는 ‘아름다움의 법칙’에 맞추는 일이다. “강압 없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유로움’으로의 상승을 의미한다. ‘자유로움’으로의 상승은 활력의 증가를 낳고 활력의 증가에서 기쁨, 행복, 사랑이 나온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는 ‘자유로움’으로의 상승을 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지만, 인류사에서 드문드문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자유로움’으로의 상승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맡겨져 있다. 훌륭한 예술작품들은 이러한 성취의 강력한 일부이다.96 예술작품의 뛰어남은 예술가의 ‘사적’ 성취에 국한되지 않는다.97 예술가의 능력은 공동체 전체에 의해 여러 세대에 걸쳐 양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사유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기의 정확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예술은 어떤 힘의 본능적이고 필연적인 결과인데, 이 힘은 정신이 여러 세대를 거침으로써만 발전될 수 있으며 특정의 사회적 조건들—이 조건들은 그것들이 규제하는 능력이 느리게 성장하는 만큼이나 느리게 성장한다—에서 마침내 살아나게 된다. 고결한 예술이 존재하려면 강력한 역사의 전 시기가 집약되고 수많은 죽은 이들의 열정들이 응축되어야 한다.98
그래서 “러스킨에게는 예술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99
(···)
♣
========
주석
01 이 책의 한국어본은 영미문학연구회의 (나를 포함한) 여러 영문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2012년에 출판되었다.
02 Introduction to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The Complete Works of John Ruskin, Library Edition 1903, Volume VIII, xxxix쪽. ‘Library Edition’은 쿡(E. T. Cook)과 웨더번(Alexander Wedderburn)이 편집한 러스킨 전집의 표준판이다. 앞으로 러스킨의 저작의 특정 대목을 인용할 경우 저서명이나 글 제목은 따로 밝히지만 출처로는 ‘Library Edition’의 몇 권, 몇 쪽인지만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예) 전집 9권 69쪽의 경우: LE V9, 69쪽.
03 같은 책 xli쪽.
04 이상 LE, V18, 148쪽. 『현대 화가론』(Modern Painters)은 1843년에 1권이 나왔고 3년 후인 1846년에 2권이 나왔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1856년에 3권과 4권이 나왔고 다시 4년이 지난 1860년에 마지막 권인 5권이 나왔다. 2권과 3권 사이의 10년 동안 러스킨은『 건축의 일곱 등불』(1849)과『 베네치아의 돌들』(총 3권, 1851-53)을 썼다.
05 같은 책 149쪽.
06 같은 책 150쪽. “수정으로 된 궁전들”은 1851년 영국에서 만국박람회(Great Exhibition)가 열린 건물인 수정궁(Crystal Palace)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수정궁은 원래 세워진 하이드 파크에서 1854년 런던 남부의 시더넘 힐(Sydenham Hill)로 옮겨졌다가 1936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러스킨은 수정궁이 기술적 재능은 빛날지라도 예술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07 한국어 번역본으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김석희 옮김)가 있다.
08 Modern Painters, vol. 2, LE V4, 29쪽.
09 러스킨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러스킨은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의 문화에서 성장했으며, 그의 글에는 성경에서의 인용이 빈번하게 나온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가면서 협소한 종교적 틀을 벗어났다. 본서의 1880년판 서문에도 나와있듯이 러스킨은 이 책을 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을 담은 대목들을 1880년판에서는 삭제한다. “…극단적이고 전적으로 거짓된 프로테스탄티즘을 담은 몇몇 부분은 본문과 부록에서 똑같이 빼버렸[다].”(본서 7쪽) 그는 나중에는 기독교를 떠날(‘탈개종’할) 생각까지 하게 된다. 물론 그는 ‘탈개종’을 하지는 않고 기독교도의 범위 내에 머물게 되지만, 이때 그의 기독교는 기독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관용적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10 LE V4, 28-29쪽.
11 LE V18, 180쪽.
12 “확실하게 좋은 것은, 첫째는 사람들을 먹이는 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입히는 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마지막으로는 예술이나 과학이나 기타 어떤 사유의 주제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즐겁게 하는 데 있다”. 같은 책 182쪽.
13 ‘삶의 가능성의 차원’이라고 좀 길게 부를 수도 있다.
14 러스킨이 생각하는 ‘인간 되기’는 맑스가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말하는 ‘자연의 인간으로의 생성’, 그리고 니체의 다음 대목에 나타난 ‘자연의 인간으로의 도약’과 크게 통하는 바가 있다. “진정한 인간들,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존재들, 즉 철학자들, 예술가들, 성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들의 등장을 통해 결코 도약을 않는 자연이 유일한 도약을 했다. 그것도 기쁨의 도약이다.” Friedrich Nietzsche, Untimely Meditations, ed. Daniel Breazeale, trans. R. J. Hollingdale (Cambridge University, 1997) 159쪽.
15 LE V20, 96쪽. “최고의 건축물은 멋지게 만들어진 지붕일 뿐”인데 “바티칸 대성당의 돔, 랭스 대성당이나 샤르트르 대성당의 포치, 이 성당들의 아일의 볼트 천장과 아치, 묘의 캐노피, 종탑의 스파이어” 같은 장엄하게 만들어진 지붕들은 “모두 어떤 공간을 열기와 비로부터 튼튼하게 보호할 단순한 필요로부터 나온 형태들”이다. 같은 책 111쪽.
16 1866년 인도의 오리싸(Orissa)에서 발생한 기근을 놓고 한 말이다.
17 “The Mystery of Life and its Arts”, LE V18, 177-78쪽 참조.
18 Fors Clavigera vol 2, LE V28, 360쪽.
19 LE V18, 151쪽.
20 같은 책 152쪽.
(···)
72 Lectures on Art, LE V 20, 108쪽.
73 같은 책 109쪽.
74 같은 책 112쪽.
75 같은 책 같은 쪽.
76 같은 책 113쪽.
77 제목 ‘Fors Clavigera’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원 풀이를 생략하고 쉽게 말하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훌륭하게 행동하는 힘 ② 인내하는 힘 ③ 운명을 최고의 목적에 맞추는 힘.
78 <성 조지 길드>의 기획에는 토지와의 관계 이외에도 교육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 해설에서 이것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다.
79 Introduction to Fors Clavigera vol. 1, LE V27, xviii-xix쪽.
80 정확히 말하자면 자본으로서의 화폐이다. 화폐는 자본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도 가진다.
81 Karl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MEW band 4, Dietz Verlag, 517쪽.
82 러스킨의 경우에 이 “대상에 내재하는 척도”는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경우에도 자연의 고유한 법칙은 ‘신의 명령’이다.
83 Karl Marx, Das Kapital I, MEW band 23, Dietz Verlag, 528쪽.
84 아마도 당시의 맑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순환을 극복하리라고 믿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맑스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 사회주의의 이름을 단 국가들은 모두 맑스가 생각한 바와는 다른, 군사주의적·관료주의적·국가주의적 체제들이다.
85 같은 책 529-30쪽.
86 런던 인스티투션(London Institution)에서 1884년 2월 4일과 11일에 한 두 개의 강연이다.
87 The Storm-cloud of the Nineteenth Century, LE V34, 7쪽,
88 같은 책 xxvi쪽,
89 “General Statement of St. George’s Guild,” Guild and Museum, LE V30, 48쪽.
90 : “그렇게 열등한 정신들의 노동의 결과들을 수용하고, 불완전함이 가득하며 모든 터치마다 그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단편들로부터 장엄하고 나무랄 데 없는 전체를 세워 올리는 것이 고딕 건축 유파의 주된 감탄할 만한 점일 것이다.” The Stones of Venice vol 2, LE V10, 190쪽
91 Cestus of Aglaia, LE V19, 60-61쪽 참조.
92 The Stones of Venice vol. 2, LE V10, 193쪽.
93 이는 현대의 발전된 첨단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첨단 기술은 인간의 발전된 힘의 결과물이지만 거기에 인간이 예속되면 (이 예속은 러스킨의 시대에서나 우리의 시대에서나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역시 인간의 활력은 감소된다.
94 LE V30, 48쪽.
95 Cestus of Agalia, LE V19, 125쪽.
96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사적 소유는 이러한 예술작품들이 인류의 활력을 증가시킬 유산이 되는 데 방해가 된다. 예컨대 피카소의 어떤 그림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프리포트(Geneva Freeport)의 보관함 같은 곳에 넣어서 보관되고 있다면, 이 그림은 그렇게 보관되는 동안은 그저 한 개인의 사유재산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네바 프리포트는 예술품 및 기타 귀중품을 보관하는 보관소로서 보관품 가운데 40%가 예술품이고 그 총 가치는 미화 1천억 달러(한화 100조원)로 추산된다. 2103년 현재 이곳에는 120만 점의 예술작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피카소의 작품도 약 1천 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97 ‘사적’은 ‘개인적’과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적인 것’들은 아무리 잘 모여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인 것’은 협동의 방식으로 모여서 공통체(commons)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들의 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적인 것’의 축적은 활력이 아니라 권력의 축적이며 권력의 본질은 활력을 제한하는 데 있다.
98 : 98 “The Mystery of Life and its Arts”, LE V18, 169-170쪽.
99 : 99 Introduction to Fors Clavigera vol. 1, LE V27, xvii쪽.